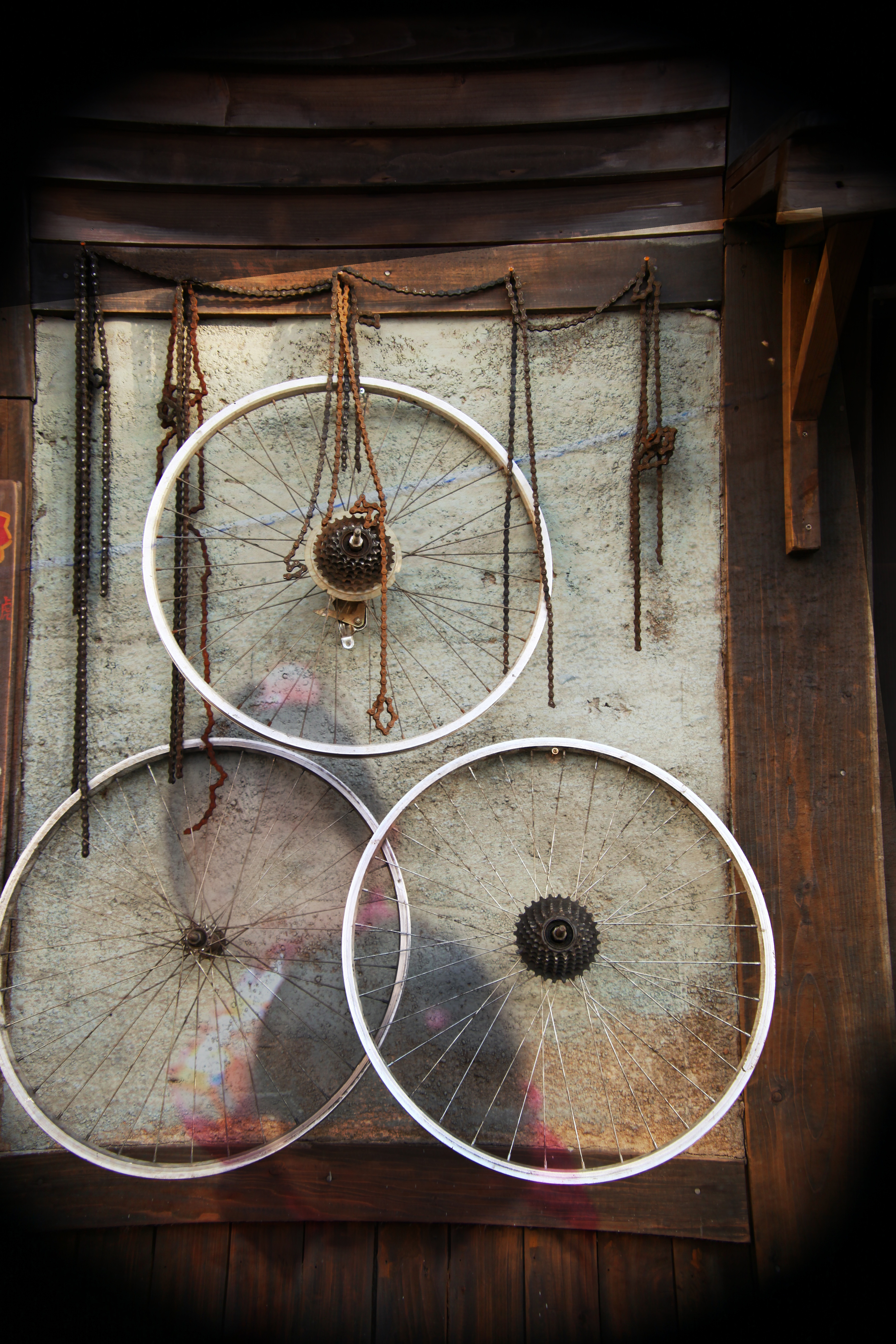오래전, 공직에 있을 때다. 차관이 국장을 부르더니 장관의 경고를 전했다. ‘회의 때 장관 뜻에 반反하는 의견을 말하지 말라.’였다. 귀를 의심하고 넋을 잃은 국장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말했던 두어 번의 일을 더 듬어낼 수 있었다. 대면의 일자(一) 충고와 삼자를 건너는 갈지자(之) 힐난詰難은 모양새만 봐도 네 배의 강 도强度로 세게 꽂힌다. “중지衆智를 모으자는 회의 아니던가요?” 목에 걸린 가시를 내뱉듯, 국장의 대꾸는 받은 힐난의 충격보다 더 불손했다. 처신을 살피게 해 주려다 머쓱해진 상관의 면전에 뱉어낸 부하의 다음 한 마디에는 더욱 가시가 돋아있었다. “목에 칼이 와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요!” 피의 왕 연산은 신하들에 게 신언패愼言牌를 채워 입을 봉쇄하고, 유일하게 진언進言했던 내관 김처선金..